[그림]Caravaggio (伊,1573 - 1610) ◈ The Seven Acts of Mercy(1607) 
Sergei Trofanov & Djelem ◈ Pole
그림을 클릭하면 큰그림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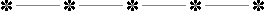
7가지 자비로운 행동
카라바조는 1607년 <일곱 가지 자비로운 행동>이라는 대작을 그리는 일에
착수했다. 그는 하나의 화폭에 일곱 가지 자비의 행동을 모두 담기로 했다.
이는 종교화 역사상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일이었다.
극장 무대를 연상시키는 하나의 공간에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찬 가운데,
캔버스는 칸막이를 애용해 반으로 나뉘어져 있다.
캔버스 위쪽에는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세상의 어둠과 서로 부둥켜 안은 천사
둘을 바라보면서 공중에 떠 있다. 여기서 정죄의 성모이면서 자비의 성모이기도 한
마리아는 구원의 젖을 상징한다.
그녀의 발 아래에서 분주하게 돌아가는 인간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주어진 은혜를 자각하지 못하는 한
인간의 고통은 끝없이 계속될 뿐이다.
영국의 예술사학자 헬렌 랭던(Helen Langdon)은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 구원의 희망은 아득하기만 하다.
그는 그 자신의 인생 역정과 구원에 대한 갈망을 연상시키는
격렬한 장면들을 통해 공포와 도주, 갑작스레 찾아온 죽음의 위협을 표현한다.
그와 동시에 그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떠들썩한 분위기는..
훌륭한 작품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구원을 갈구하는
그 시대의 풍조를 완벽하게 옮겨놓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림]◈ The Seven Acts of Mercy Detail ◈ 
캔버스 왼쪽 아래에는 벌거벗은 한 남자가 슬픔에서인지
감사의 마음에서인지 손뼉을 치고 있는 가운데, 그의 동료는
잘 차려 입은 신사로부터 외투를 받아들고 뛸 듯이 기뻐하고 있다
(병자를 돌보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자선 행위),
그는 로마 병사 신분으로 아미앵 성곽을 지나다 헐벗고
가난한 자를 보고 자비를 베푼 성 마르티누스의 본보기를 따르고 있다.
야코부스의 <황금 전설>에 보면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자 마르티누스는 이 남자야말로 자신을 위해
하느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는 칼을 꺼내 입고 있던
외투를 잘라 한쪽을 거지에게 주고 나머지 한쪽으로는 자신의 몸을 감쌌다"는
내용이 나온다.
신사는 복장으로 미루어 순례자 일행 중 한 명인 듯하다.
순례자들은 체격이 다부지고 온화한 인상을 주는 한 남자의 환대를 받고 있다.
아마도 여인숙 주인인 듯하다(여인숙은 집 없는 나그네들이 묵는 곳이다).
[그림]◈ TThe Seven Acts of Mercy Detail ◈ 
그들 뒤로 반쯤 헐벗은 거지가 당나귀 턱뼈로 물을 마시고 있다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는 자선 행위),
카라바조와 동시대인들은 물을 뜨는 주발과 당나귀 턱뼈로
적들을 때려눕힌 뒤 사막에서 갈증으로 고통을 겪다가
"하느님께서 우묵하게 꺼진 데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시어
그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린" 삼손과 연계시켰다.
[그림]◈ TThe Seven Acts of Mercy Detail ◈ 
그들의 오른쪽에는 하얀 저고리와 진홍색 모자 차림의 한 남자가
시체를 떠맨 또 다른 남자에게 촛불을 쳐들고 있다
(죽은 자를 거두어 묻어주는 자선 행위),
마지막으로 젊은 여인이 눈앞의 광경을 지켜보면서
창살 뒤에 갇힌 늙은 남자에게 젖을 빨리고 있다
(감옥의 죄수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선 행위),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대 로마의 키모와
페로 이야기를 재현하고 있는 듯하다.
카라바조의 그림을 통해 다시 태어난 옛날 이야기 속 인물들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지들의 얼굴과 육신과 닮아 있다.
카라바조의 무대는 인위적이거나 비유적이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 교회가 빈민들을 정화시키기 위해 준비한 무대나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코메디아델라르테의 정형화된 무대와도 거리가 멀다.
극장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비가 베플어지는 장소인
카라바조의 무대에는 이 얘기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찰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카라바조는 국외자로서의 관찰자를 배격한다.
즉 그는 관찰자에게 배우의 역할을 맡긴다.
그는 관찰자로 하여금 관객의 입장에서 팔짱을 낀 채 가만히 지켜보게 하기보다
사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게 만든다.
그 결과 관찰자는 비참한 형제 자매들에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통해 카라바조는 관찰자를 행동하게 만든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행동이 결여된 연민은 자비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생각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
[그림]◈ TThe Seven Acts of Mercy Detail ◈ 
무대 전체는 카라바조의 후기 작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강렬한 노란색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카라바조보다 몇 년 앞서 태어난
화가 프란체스코 알바니(Francesco Albani, 1578~1660, 이탈리아 화가)는
이 색을 가리켜 '땅의 살빛'이라고 일컬었다.
이 빛의 출처는 과연 어디일까?
현관에 서 있는 남자가 들고 있는 횃불에서 나오는 빛도 아니고,
여인숙 주인의 뒤편에 있는 방에서 나오는 빛도 아니다.
X-레이로 촬영한 결과 이 성스런 빛은 나중에 덧칠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오몬테의 귀족들이 그림이 완성된 후 카라바조에게 마리아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아무리 그들이 앞서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림에서 너무 세속적인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의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성스런 존재가 필요했을 것이다. 하지만 장면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그림 속 인물 하나하나를 감싸안는 이 빛은 사방에서 나온다.
왼쪽에서 보면 빛이 천사들의 날개와 어깨 위로,
오른쪽에서 보면 천사들의 가슴 위로 쏟아져 내린다.
빛은 성모와 아기 예수의 얼굴에 이어 여인숙 주인과
목마른 노인, 순례자, 자비로운 신사, 횃불을 들고 있는 남자,
젊은 여인과 죄수의 얼굴을 비춘다.
또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벌거벗은 남자의 등과
매장을 위해 옮겨지는 시체의 발도 빛에 노출되어 있다.
이처럼 빛은 사방에서 나온다.
마치 장면 전체가 우리가 가져왔을지도 모르는 빛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듯하다.
이 그림에서 빛은 관찰자 자신의 빛이다.
빛이 없다면 일곱 가지 자비스런 행동은
그림자와 암흑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다.
-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