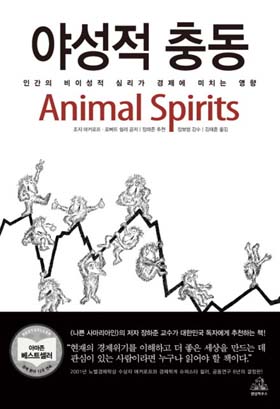
야성적 충동--조지 애커로프,로버트 쉴러
야성적 충동은 무엇인가?
“인간의 적극적인 활동의 대부분은, 도덕적이거나, 쾌락적이거나 또는 경제적이건 간에 수학적 기대치에 의존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낸 낙관주의에 의존하려 한다. 이러한 인간의 불안정성이 판단과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인간의 의지는 추측컨대, 오직 ‘야성적 충동’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며, 계산적인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 중에서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 을 말함으로써 자유주의 경제학의 창시자가 되었고, 케인즈는 시장의 실패를 들어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며 경제학의 양대 산맥을 형성해왔다. 자유주의 경제학 (혹은 표준경제학 내지 정통 주류경제학) 에서는 개인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상정한다. 이 완벽한 인간들은 시장의 정보를 완벽하게 흡수하고 단 한번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항상 수요 공급의 균형점에 온전하게 도달한다. 해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들은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완전 균형이라는 종교의 교도들이다. 정말로 인간은 이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가?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유형의 인간은 대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행동경제학에서 상정하는 인간은 실수를 밥 먹듯 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이 비일비재 하며 비합리적인 행동을 거리낌없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의 행동경제학자가 실험을 한 적이 있다.
지나가는 행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인간이 항상 돈을 바라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주류경제학의 이론을 비웃기로 작심하고 거리로 나갔다. 길가에 이삿짐을 실은 트럭을 세워 놓고 낑낑거리며 물건을 내리면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아무 대가를 말하지 않고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부분 행인들은 별 말 없이 이삿짐을 내리는데 동참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길 가는 사람에게 이사짐을 내리는데 5달러를 줄테니 좀 도와달라고 했다. 그러자 대부분 행인들은 뭐 저런 새끼가 있어, 하는 듯한 눈빛으로 가던 길로 종종 걸음을 치기 바빴다.
만일 합리적, 이성적 인간이라면 무상으로 이삿짐을 내리는 부탁을 거절했어야 한다. 그리고 돈을 주면 기꺼이 동참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인간은 돈보다 자존심을 더 중시하는 (비합리적) 경향이 있다. 아니 기껏 5 달러야? 자존심 억수로 상하는구만, 하고 열받아서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더불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보면 동정심과 이타심이 발동하여 아무런 댓가 없이 도움을 주기도 하다. 이처럼 인간은 복잡하다. 주류경제학은 이런 인간의 복잡다단한 속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인간은 오로지 이기적 동기에 의해서만 활동하며, 인간 개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결국 시장은 균형에 도달하며 그 이기심이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경제가 발전한다고 결론낸다.
무덤 속에서 부활한 케인즈 다시 케인즈로 돌아가자. 케인즈는 인간이 불안정한 존재여서 판단 역시 즉흥적이며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를 야성적 충동이라고 부른다. 이 동물적 충동이 내린 판단이 인간의 본 모습에 가깝고 수학적 이성을 가진 인간은 그야말로 상상속의 인간이라는 것이다. 해서 야성적 충동을 이해해야만 경제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담스미스에게 '보이지 않는 손' 이 있다면 케인즈에게는 '야성적 충동'의 인간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 케인즈 후예들이 케인즈를 말아 먹었다고 한다. 표준경제학(고전파와 신고전파)과 지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야성적 충동의 귀와 자지를 쏘옥 빼 버린 당나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당나귀의 상징은 큰 귀와 엄청나게 큰 좆 이다. 이 두 가지가 당나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데 귀와 좆을 빼 버리면 당나귀는 이미 당나귀가 아니다) 그 이후로 케인즈노믹스는 계량화, 수리화, 형식화의 길로 걸으면서 신고전파 종합 ( = 거세된 케인즈 + 신고전파 = 신케인즈학파) 에 이르고 결국 정신분열증에 걸려 버리는 것이다. 그 뒤로 시카고의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통화주의 학파가 경제학계를 휘어 잡으면서 케인즈 학파의 깔딱거리는 숨통을 끊어버렸다. 바야흐로 신자유주의 세상이 열린 것이다. 이후 30 여년이 지나 세상은 참으로 엿같은 곳이 되어 버렸고 급기야 2007년 여름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케인즈가 남긴 유산이 깡그리 말살 된 것은 아니다. 통화주의가 천하를 지배하던 시절에도 새케인즈주의라는 학파를 만들어 그 맥을 이어온 학자들이 있다. 작년 노벨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 조지프 스티글리츠. 그레고리 멘큐, 로렌스 서머스, 데이비드 로머 등이다. 이들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신자유주의가 비난을 받으면서 정부개입이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들고 나타난다. 무덤에서 케인즈를 꺼낸 것이다. 금융시장의 과도한 방임을 규제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정부가 개입해서 취로사업도 해야 한다며 시장은 항상 옳고 전지전능 하다는 논리를 발로 뻥 차버린 것이다. 역사는 돌고 돌며 쥐구멍에 볕이 비치면 쥐새끼들 눈탱이가 시린다고? 이 책은 8 가지 쳅터로 구성되어 있다. * 왜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통독을 해서 대체적인 개요는 파악했지만 도무지 갈팡질팡 대는 문장들 때문에 짜증 이빠이 나는 독서였다. 미국에서 원로 학자들이나 대가들은 멘 나중에 교과서를 쓴다고 한다. 대중들이 알기 쉽고 이해가 편한 책 말이다. 자기들끼리만 아는 은어 같은 글로 구성된 책이 아닌 필부필부가 다 읽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책. 두 대가가 만났다면 분명 이런 책이 나왔어야 한다. 행동경제학이 장사가 된다니까 시류에 야합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기대에 못미치는 책이다. 아쉽다. [출처] 야성적 충동--조지 애커로프,로버트 쉴러|작성자 포카라
* 왜 중앙은행이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가? (현재의 금융위기에 필요한 조치는?)
* 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 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은 장기적으로 반비례하는가?
* 왜 미래를 대비해야할 저축을 비계획적으로 운용하는가?
* 왜 금융시장과 기업투자는 변동성이 심한가?
* 왜 부동산시장은 주기적인 부침을 겪는가?
* 왜 소수계의 빈곤은 계속 대물림되는가?
'지혜의 향기 > 독서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SYK글로벌 스티브 김 대표이사 강의 동영상 (0) | 2010.07.25 |
|---|---|
| 행태경제이론 : 36.5℃ 인간의 경제학 (0) | 2009.10.07 |
| [2부] 미래의 조직으로부터의 초대 (0) | 2008.11.19 |
| the future of leadership [1부 불확실한 미래에 대처하는 확실한 준비] (0) | 2008.11.19 |
| chapter 10 - 역사,흥륭과 쇠망의 이중주-쇠망사 (0) | 2008.11.19 |